"한국도 트럭을 만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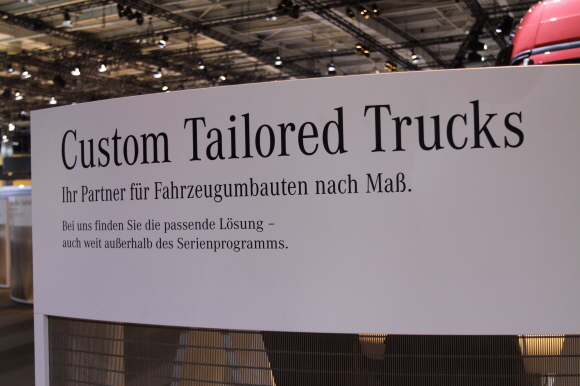
|
| 트럭도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 |
전시장을 찾은 한 유럽인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23일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2010 하노버 국제 상용차 박람회"에 현대·기아나 타타대우같은 국내 상용차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다. 특히 이번 제63회 국제 상용차 박람회는 43개국 1,751개 업체가 참여해 신차 272종을 쏟아낼 만큼 중요한 상용차행사였으나 한국업체의 이름은 없었다. 그나마 한국타이어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상용 타이어를 선보인 게 고작이었다.
한국 상용차업체가 유럽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 환경규제 때문이다. 현재 유럽 상용차는 유로5 규제를 넘어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제 막 유로5 기준을 맞춘 한국보다 친환경부문에서 한 발 앞서가는 셈이다.

|
| 세트라 2층버스의 실내공간 |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는 이제 유로5에 대응하는 차를 내놓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환경규제는 물론 안전성과 편의성, 내구성 등에서도 유럽업체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에 전시회 참가가 무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품력에서도 확실히 유럽 브랜드가 앞섰다. 친환경 기술은 물론 안전과 편의품목에서도 격차가 확실히 드러났다. 먼저 친환경성을 보면 유럽의 여러 제조사들은 유로6의 이전 단계인 EEV 수준을 충족시키는 신차를 내놓고 미래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DPF같은 후처리 필터를 쓰지 않으면서도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자랑했다.

|
| 버스에 탑재된 차간 거리 조절을 위한 레이더 |
한 국내업체는 유로5 규제를 충족시키는 SCR 방식의 트럭을 오는 10월 선보일 예정이다. 요소수용액을 주입하지 않는 EGR 방식이 국내 현실에 맞다는 그 동안의 주장과 상반되는 행동이다. 물론 환경이 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선진업체의 발빠른 대응을 보면 이는 단지 핑계로 들릴 뿐이다.
안전품목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앞차와의 거리조절은 기본이고 사고위험을 감지하면 알아서 멈춰서고, 추돌 때는 운전석 위치를 변화시켜 운전자의 부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한 차도 소개됐다. 여러 차례 지적된 국내업체의 상용차 안전성 문제를 떠올리면 씁쓸함이 남는 대목이다. 첨단 편의품목과 감성품질도 마찬가지다. 며칠동안 유럽 최고급 브랜드의 버스를 이용해보니 정숙성과 승차감, 편의성에서 국내의 고급 버스와는 비교가 안됐다. 국산 승용차와 수입차의 차이와 비슷했다. 섬세함을 강조하는 건 물론 탑승객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챙겨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
| 오펠의 비바로 전기 밴 |
한국 승용차는 일정 수준에 올라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상용부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업체들이 유럽과 미국같은 핵심 시장 이외의 신흥시장에서 꾸준한 판매증가세를 보이지만 이는 단지 "낮은 가격" 덕분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뛰어난 제품력과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유럽과 미국 상용업체를 상대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오죽하면 전시장에서 만난 유럽인이 "한국도 트럭을 만드느냐"는 질문을 했을까. 분명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상용차시장은 일반적으로 승용차보다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도 비교적 덜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만큼 제품과 브랜드 충성도가 매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뛰어난 제품력을 보유하는 건 물론 소비자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심어줄 때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법이다. 이런 확신은 단지 가격과 모양 흉내내기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럽업체들은 끊임없이 소비자와 "소통"하고 그들에게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려고 노력해 왔다. "비싸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기에 비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때다.

|
| 폭스바겐은 1985년 모델도 전시했다 |
박찬규 기자
star@autotimes.co.kr